역시 예전에 쓴 글을 블로그로 옮깁니다.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아서 볼 수 있을 겁니다.
Chilled Factor
2. 마법사의 탑
그 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영지를 대대로 다스려온 영주도,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존경받는 촌장도 그 탑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에 대해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네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대부터, 그리고 그 이전 그들이 이 땅에 살게 되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그 탑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곳에 계속 서있었다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탑, 석양빛을 받을 때면 불타는 듯 빛나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거나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상아빛의 거대한 탑, 언제나 그곳에 서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대지가 무너지고 종말이 와도 그 곳에 영원히 서있을 것이라고 전신으로 무언의 외침을 발하고 있는 그 탑을 무지와 압도에서 우러나는 외경을 한껏 담아서 이렇게 부르곤 했다.
마법사의 탑.
***
서녘으로 느지막히 기운, 졸음을 부르는 태양이 아쉽기라도 한 양 온 몸을 붉은 금색으로 물들인 채 어딘가를 붙잡고 버티기라도 하겠다는 양 사방에 석양의 손길을 내뻗었다. 하루 중의 다른 때였다면 고고한 상아빛으로 대지 위에 굳건히 서있었을, 마법으로 수호받고 있다는 전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처음 세워진 그 날(물론, 아무도 '그 날' 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로 돌 부스러기 하나 떨어져나가지 않고 조그마한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서있는 마법사의 탑도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다. 길을 가던 음유시인에게 부탁한다면, 이 탑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노래 한둘쯤은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아니, 사실 굳이 부탁을 하지 않아도 넘쳐오르는 시상에 음유시인쪽에서 먼저 노래를 하나 불러줄테니 지금부터 잘 들으라고 할 지도 모른다. 물론 특별히 로맨틱하고 지나치게 무모한 음유시인이라면 이 풍경 앞에서 노래를 짓기 보다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 서사시에 남을 모험을 펼지고 싶어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탑을 만져보기는 커녕 살아서 태양 빛을 다시 보기도 힘들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만은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탑을 둘러싼 작은(그러나 치명적인) 숲에서 살아남아 빠져나올 수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리라.
완전한 것은 어떤 흠집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식의 강박관념을 비웃기라도 하듯, 탑에는 몇 개의 창문이 무심하게 나 있었다. 물론 사람이 살려면 창문이 없는것 보다야 있는것이 좋으니만큼 이 탑에도 창문이 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창문들 중 하나에서 보이는 것에는 약간의 의아함을 느껴도 좋으리라. 머리 하나가 창틀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손바닥으로는 턱을 고인 채 바깥쪽으로 무성의하고 무감동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은 이런 경우에 으레 연상될 법한 꼬부랑 수염의 늙은이가 아닌, 잘 봐줘도 열 두어살이나 될까싶은 어린애인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또 한번 벗어나는 일이지만,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과 일조량 부족에 기인한듯한, 매끈한 흰 피부를 가진 이 소년의 나이는 열 네살이었다. 어쩌면 운동을 너무 안해서 그런걸지도 몰라, 하고 평소에 소년은 생각하곤 했지만,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는 가죽공보다는 책이, 들판보다는 서고가, 공차기보다는 독서가 더 마음에 들었으니까. 호기심도, 소질도, 머리도, 끈기도, 지식욕도 갖춘 그 소년은 그야말로 견습생으로는 적격인 인재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 8명뿐인 타워마스터(혹은, 탑주)의 어프렌티스가 되기에는. 왜, 언제 여기에 오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년은 이곳에서 대충 세 해째 늙은 타워마스터의 시중을 들면서 마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기준('마법사'라는 단어와 '일반적'이라는 단어만큼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도 없겠지만)으로 보자면 별로 빠르다고야 할 수 없는 진도였지만, 그것은 자질 부족이라기보다는 넓은 지식욕에 기인한 것이었다. 소년은 심지어 마법보다도 책을 좋아했다. 그리고 스승도 그것을 나무라지는 않았고. 골빈 칼잡이들에게라면 모를까, 마법사에게 지식이 해가 되지는 않는다(똑똑한 칼잡이가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것은 사실이고, 불행하게도 마법사의 지식이란 그 자신보다는 주위 사람에게 재앙이다)는 것이 스승의 믿음이었으니까.
어제도, 그 전날에도 그러했듯이, 석양은 곧 체념한 듯 그 손길을 천천히 거두어들이고는 꼬리를 끌며 사라져 갔다. 이윽고 석양의 빈 자리를 메꾸듯 짙은 청색에서 검은색으로 물들어가는 어둠을 보며, 어느새 하나 둘 조용히 반짝이기 시작하는 별들을 바라보던 소년은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며 창문에서 시선을 돌려 아래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평상시보다 약간 늦어질 듯 하다.
***
소년은 기다란 나무 주걱으로 솥을 저었다. 부글부글. 음침한 조명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냄비 속의 내용물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끓었다. 이 방의 유일한 조명인 솥 밑의 장작불과 솥이 피워내는 증기가 합세해 소년의 얼굴 위에 복잡하면서도 기괴한 음영을 새겨내고 있었다. 3주 가까이 탑 꼭대기의 연구실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않는 스승에 대해 생각하던 소년은, 탄 냄새를 맡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아차, 스튜가 좀 탔겠네.
주인의 취향을 닮았는지 침침한 조명이 군데군데 빛나고 있는 나선형 계단을 따라, 소년은 스튜 그릇을 들고 천천히 올라갔다. 탑의 내벽도 외벽과 마찬가지로 반사율 좋은 상아빛이었기에 그정도의 조명만으로도 계단을 오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나름대로 놀라운 모습이라고 소년은 생각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생동안 한 번 보기조차 힘들 마법의 불이(비록 좀 침침하다고는 해도), 이 탑 안에서는 횃불 대용으로 아무렇게나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 탑 안에서만은, 마법의 기적이란 곧 일상이었다.
똑똑. 최상층에 도착한 소년은 문을 두 번 노크했다. 어차피 이런다고 스승이 나와서 식사를 받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놔두고 가면 다음에 올때는 꼭꼭 빈그릇으로 바뀌어 나와있는 것이다. 잠시 자그마한 기대 비슷한 것에 기다려 봤지만 역시나 대답같은 것은 없었고, 소년은 스튜를 문앞에 놓고 그 옆의 빈 그릇을 챙겨서 내려왔다.
아래층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먹던 음식이 흘러내려 옷을 더럽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소년은 역시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쨌거나 2주하고도 5일, 그러니까 17일*동안이나 스승의 얼굴도 못 본 것이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뭘 하는건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동안 해야 할 일을 시키지도 않고 틀어박혀 있는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물론 책은 많으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는것은 많다. 그러나(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소년은 원래 호기심이 많았다. 17일이나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심지어 책으로도 그의 호기심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어쨌거나 14살짜리 꼬마 아닌가.
게다가 소년은 스승이 가지고 들어간 꾸러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도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대개의 경우 그렇듯이 천으로 둘둘 감아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실루엣을 가늠해보지 못하는 건 아니다. 시간도, 상상력도, 호기심도 풍부하고 할 일도 없는 소년의 머릿속에는 결국 결론이 하나 떠올랐다.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가늠해보면 그건 검일수밖에 없을 터였다. 몇마디 붙여보자면 '아주 이상하게 생긴 검'.
그래서 소년은 모종의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그때부터 소년은 밤낮없이 스승의 연구실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흘이 흘렀다.
***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구나.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냐. 사람이 아니라면 비슷한 거든 뭐든간에... 그 육체와 분리된 영혼... 분리해낸 영혼이나 한 개체 전체를 보석에 봉인하는 기술이야 많이 쓰곤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사고기관 없이도 봉인된 영혼이 제 기능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널려있는 용도 불명의 잡동사니들, 연구실 곳곳에 교묘하게 배치되어 거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연구실 전체를 비추는 마법의 불들 - 의외로 이번에는 침침하지 않은데다가 오히려 지나치게 밝은 것이 아닌가 싶은 - , 안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도 여기 저기 그슬려있는 방화벽(물론 방화마법을 걸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풍성한 턱수염의 마법사와 그 앞에 놓인 관찰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꼬불꼬불한 글씨와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가득한 결계와 주박들 속에서 영혼의 프리즘 soul prism 으로 실험 대상(소년의 추측대로, 검이었다)을 관찰하던 타워마스터, 아이보리 메이지는 피로해진 눈을 문지르면서 혼잣말을 시작했다. 늙은이다운 버릇이다.
"그런가, 그렇다면 이 혈석血石*이 유사기관으로 작동하는 겐가? 아니... 아니야. 사고기관만이 아닌게야... 암... 단순히 유사기관이라든가, 그런 대체물이 아니라... 차라리 영혼의 그릇이라고 부르는 편이 낫겠군. 아니... 그릇이 아니고... 그래, 차라리 이건 새로운 육체... 검신 내부로 신경계에 순환계까지 뻗어있고... 가만, 가만 보게. 이러한 구조라면, '살아 있는' 거란 말인가? 여보게, 궁금해지는데 어디 내 질문에 대답 좀 해 볼 생각 없겠나? 말 좀 해보게나. 라인"
바로 자신이 말은 커녕 최소한의 사고회로를 유지하거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지각하는 것조차 힘들정도의 결계와 주박으로 그(혹은, 그 검)를 묶어놓았다는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타워마스터는 라인에게 말을 건넸다. 말을 하는 쪽은 수염이 풍성하고 안경을 쓴데다가 복잡한 주름살을 얼굴에 그린 할아버지임은 두말 할 나위 없는 것이지만, 듣는 쪽은 매끈한 검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좀 있는 모습이다. 부검중인 시체같다고나 할까. 검신과 칼막이, 손잡이가 모두 분리되어 그 안쪽에 뻗은 혈관과 신경이 드러난 모습은, 나름대로 그로테스크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한 혈석. 말라 비틀어진 피 찌꺼기와 같이 생긴, 누천년간 세계에 발산된 악의와 고통이 모두 퇴적되어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영혼의 그릇.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그 돌은, 움직이되 살아있지 않은 언데드처럼 메스꺼움과 부조화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그 혼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전혀 인간의 영혼이 아니고. 허나... 한 때는 사람이었던 것 아닌가? 어찌 이리 될 수 있는가? 인간의 영혼이 무슨 흙이나 쇠도 아닐진대, 이렇게나 뒤틀려 있을 수 있다니..."
늙은 마법사는 고개를 저었다. 마법사라 해도 결국 인간인데, 인간의 영혼을 무슨 풀빵 찍어내듯이 틀에 맞춰 변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은 인간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역시 항간의 소문이란 의외의 통찰을 담고 있는가. 악마가 만든 칼이란 말이더냐."
아무려면 신이라든가 천사가 만들었을리는 없으니까... 늙은 마법사는 조금 쉬기로 했다. 왕년에야 수십일 밤을 지새우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연구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젠 무리인 것이다. 게다가 상대가 상대이니, 지쳐서 정신을 잃는다거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일이다. 결계를 정비해두고, 늙은 마법사는 잠을 청했다. 네다섯 시간 정도는 자 둘 생각이었다.
결국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
스승이 깊이 잠들었음을 확인한 소년은 방문에서 귀를 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매일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귀를, 눈을,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스승의 연구실 안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피곤하고도 지루한 일이었지만, 그 기다림 끝에 스승이 드디어 잠들었다는 것, 다시 말해 이제 그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소년에게서 피로를 말끔히 씻어가버렸다. 소년은 대개 호기심에 가득찬 사람들이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직전에 그러하듯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눈을 빛내며 손잡이에 손을 가져갔다.
"끼기기긱..."
마법으로 충만하여 기적이 일상인 탑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볼품없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순간, 소년은 문 안에서 '두려움' 이 흘러나와 자신을 감싸는 듯한 감각에 진저리를 쳤다. 그것이 위험한 것을 만났을 때 느끼게되는 본능적인 공포일지, 위대한 스승의 명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반응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는 곧 연구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건 두 번도 없을 기회야. 과연 소년의 발걸음을 이끈 것이 호기심뿐이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질척질척한 모종의 유혹 내지 암시가 은연중에 섞여있었을지는 이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모든 것이 명백하다고 말하는 듯한 그림자 없는 조명과는 반대로 퀴퀴한 공기에 섞인 약간의 불길한 예감이 다시 한 번 경고하듯 소년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 불길한 예감은 위대한 스승님이 비록 잠들어 있지만 바로 옆에 있다는 긴장감에 섞여버린 다음 시시각각 소년의 머릿속에서 부풀어오르는 호기심에 짓눌려버렸다. 소년은 연구실의 중앙에 목적인 '무언가' 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 때, 소년이라고 하는 불확정요소가 연구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들어옴에 따라 연구실 전체에 작용하던 결계의 구속력이 급속도로 헝클어지며 약해졌다. 방향성과 조직성을 잃어버린 주력이 주박에 간섭을 일으키면서 파괴가 파괴를, 혼돈이 혼돈을 낳아 무질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갔고, 그 결과는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라인을 구속하던 수많은 결계와 주박이 단 몇 초만에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좋은 상태로 헝클어져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소년이 라인의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이미 라인은 꿈틀거리며 본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무생물의 질감을 가진 물체가 그야말로 생물적인 느낌으로 꿈틀거리며 '해부도' 에서 '검' 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분히 공포스러운 것이지만, 호기심이란 - 혹은 마법사의 호기심이란 - 공포 자체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그 공포 자체에 대해 발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소년은 그 광경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소년은 훌륭한 마법사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말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대개의 훌륭한 마법사는 바로 그 호기심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바, 이 점에서도 소년이 훌륭한 마법사의 자질을 지녔음은 드러난다.
호기심과 흥미로움, 신기함으로 응시하고 있는 소년의 눈 앞에서 라인은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그 움직임이 멎자 소년은 자신의 추측이 정확하게 - 최소한 겉보기에는 - 맞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검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 이상하게 생긴 검.
소년은 한동안 넋을 놓고 검을 바라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마법사의 탑에서 진짜 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을리도 없을 뿐 아니라, 그 검 자체가 상당한 이형異形이니만큼 소년이 한참동안이나 검에서 눈을 떼지 못한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소년은 점차 다른 형태의 충동이 머릿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요컨대, '한 번 쥐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태어나서 다뤄본 칼이라고는 식칼에 과도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검을 쥐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지는 소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이해 여부와는 별개로 눈앞의 검을 잡아보고 싶다는 충동은 점점 커져갔다. 소년은 천천히 검에 손을 뻗어,
라인을 잡았다.
***
물론 그 때 연구실의 문을 연 자가 경험 많고 능숙한 모험자(닳고닳은 놈팽이라고 불러도 대충 들어맞기는 한다)였다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인지 잘 알았을 것이며,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뒤 돌아볼 것도 없이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연 것도, 연구실 안에 들어간 것도 젊음으로 축복받았으되 아직 경험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애송이 제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좀 진부한 명제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일에 대해서는 후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진부하고도 쓸모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무릇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계속하기로 한다.
쿵, 하는 아련하게 먼 곳에서의 이명과도 같은 소리. 혹은 그 환상. 들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한 착각. 뒤늦게나마 마법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몸 속에서 커다란 추가 떨어진듯한 진동이랄까,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을 때의 충격에서 고통만을 전부 배제한듯한 아득한 귀울림이랄까. 늙은 마법사는 정신을 차리려고, 그리고 눈을 뜨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이제야 잠에서 깨어난 신경을 타고 한 박자 늦게 격통이 흘러들어왔다. 마법사는 고통을 느꼈다. 눈을 부릅떴다. 소리를 지르려 했다. 비명을 쏟아내려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입 밖으로 제대로 된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뭔가 익숙하면서도 그 곳에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이 목줄기를 타고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을 뿐이다.
목을 관통당한 늙은 타워마스터는 비명대신 올라오는 붉은 피거품을 느끼면서, 이미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몸이 제멋대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귀를 두드려오는 이명을 느끼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니, 어쩌면 보았다고 느낀 것일지도 모르고 그도 아니라면 이미 아무 것도 느낄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시야는 흐릿해지고 눈은 광채를 잃었다. 초점이 풀리고 시야가 좁아져왔다. 이윽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단순한 농담이었기라도 한 것처럼, 남아있던 고통마저 느낄 수 없게 된다. 그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맺히지 않는다. 이미 상을 맺을 수 없게 된 눈은 예전에 담아내던 세계의 형태를 비추지 못하고 다만 흐리멍텅하다. 고통과 어이없음이 최악의 불협화음을 일으킨 마법사의 마지막 표정은, 그 두 감정이 어지럽게 범벅된 것으로, 최후라는 단어가 붙은 것들이 보통 드러내곤 하는 비장함이나 장엄함 따위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8개의 탑은 7개의 탑이 되었던 것이고, 위대한 전승의 하나가 허무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른 이야기로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돌아가 보자면,
제자는 검을 다시 뽑았다. 내려다본 눈 아래에 널부러진, 이미 생명의 흔적조차 빠져나가버린 듯한 시체의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창백했다. 그러나 그에 대비되는 연구실의 풍경은 피 한 방울 튀지 않은 채 깔끔해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 기괴한 풍경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 피는 '먹혔으니까'.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오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다려왔던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아직 더 필요하다. 어디에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던 소년은 갑자기 깨달았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잖아. 바로 여기에.
자신이 검을 거꾸로 바꿔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전에 검은 이미 소년의 몸을 꿰뚫고 있었다. 소년의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다리에서도 힘이 빠졌고, 소년은 천천히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등에 솟아오른 뿔과도 같은 모양의 검끝만이 여전히 기괴한 광택을 내면서 움직임 없이 살아 더 많은 피를 구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 탑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영지를 대대로 다스려온 영주도,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존경받는 촌장도 알지못하는 언제인가부터 아름답던 상아빛은 바래지고 생기 넘치던 숲은 황폐해지고 외부의 틈입을 거부하던 아름답던 탑신은 담쟁이 덩굴에 휘감겨 숲 속으로 침몰하듯, 혹은 아예 숲 자체가 되어가듯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오만했던 영원에의 도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허망해진 메아리만이 남아있는 그 탑에는 수많은 소위 '모험가' 들이 침입하여 한때는 위대했던 상아빛의 탑을 허물고 빛나던 지식을 약탈하고 아름답던 보물을 훔쳐갔다. 수만의 새벽이 깨어나고 수천의 보름달이 사위고 수백의 첫눈이 내리고 난 뒤에야 무너진 탑에는 빽빽하게 푸른 이끼가 끼었고 잊혀진 동굴은 무너져 다만 어둠이 되었다. 그리고 오직 아무도 그 유래를 알지 못하는 마법사의 탑이라는 이름만이 유령처럼 제자리에 남아 언제나처럼 불타는 석양과 함께 옛 영광을 희롱하고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는 일주일은 6일.
*실제 보석인 혈석(혹은 혈옥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00년 모월 모일에 작성
2004년 9월 11일에 최종수정
역시나 묵은 티가...
아아 이거 어떻게 이어 쓴답니까.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쉽게 찾아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읽어봅시다
Chilled Factor
2. 마법사의 탑
그 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영지를 대대로 다스려온 영주도,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존경받는 촌장도 그 탑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에 대해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네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대부터, 그리고 그 이전 그들이 이 땅에 살게 되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그 탑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곳에 계속 서있었다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탑, 석양빛을 받을 때면 불타는 듯 빛나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거나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상아빛의 거대한 탑, 언제나 그곳에 서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대지가 무너지고 종말이 와도 그 곳에 영원히 서있을 것이라고 전신으로 무언의 외침을 발하고 있는 그 탑을 무지와 압도에서 우러나는 외경을 한껏 담아서 이렇게 부르곤 했다.
마법사의 탑.
서녘으로 느지막히 기운, 졸음을 부르는 태양이 아쉽기라도 한 양 온 몸을 붉은 금색으로 물들인 채 어딘가를 붙잡고 버티기라도 하겠다는 양 사방에 석양의 손길을 내뻗었다. 하루 중의 다른 때였다면 고고한 상아빛으로 대지 위에 굳건히 서있었을, 마법으로 수호받고 있다는 전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처음 세워진 그 날(물론, 아무도 '그 날' 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로 돌 부스러기 하나 떨어져나가지 않고 조그마한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서있는 마법사의 탑도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다. 길을 가던 음유시인에게 부탁한다면, 이 탑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노래 한둘쯤은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아니, 사실 굳이 부탁을 하지 않아도 넘쳐오르는 시상에 음유시인쪽에서 먼저 노래를 하나 불러줄테니 지금부터 잘 들으라고 할 지도 모른다. 물론 특별히 로맨틱하고 지나치게 무모한 음유시인이라면 이 풍경 앞에서 노래를 짓기 보다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 서사시에 남을 모험을 펼지고 싶어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탑을 만져보기는 커녕 살아서 태양 빛을 다시 보기도 힘들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만은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탑을 둘러싼 작은(그러나 치명적인) 숲에서 살아남아 빠져나올 수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리라.
완전한 것은 어떤 흠집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식의 강박관념을 비웃기라도 하듯, 탑에는 몇 개의 창문이 무심하게 나 있었다. 물론 사람이 살려면 창문이 없는것 보다야 있는것이 좋으니만큼 이 탑에도 창문이 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창문들 중 하나에서 보이는 것에는 약간의 의아함을 느껴도 좋으리라. 머리 하나가 창틀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손바닥으로는 턱을 고인 채 바깥쪽으로 무성의하고 무감동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은 이런 경우에 으레 연상될 법한 꼬부랑 수염의 늙은이가 아닌, 잘 봐줘도 열 두어살이나 될까싶은 어린애인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또 한번 벗어나는 일이지만,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과 일조량 부족에 기인한듯한, 매끈한 흰 피부를 가진 이 소년의 나이는 열 네살이었다. 어쩌면 운동을 너무 안해서 그런걸지도 몰라, 하고 평소에 소년은 생각하곤 했지만,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는 가죽공보다는 책이, 들판보다는 서고가, 공차기보다는 독서가 더 마음에 들었으니까. 호기심도, 소질도, 머리도, 끈기도, 지식욕도 갖춘 그 소년은 그야말로 견습생으로는 적격인 인재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 8명뿐인 타워마스터(혹은, 탑주)의 어프렌티스가 되기에는. 왜, 언제 여기에 오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년은 이곳에서 대충 세 해째 늙은 타워마스터의 시중을 들면서 마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기준('마법사'라는 단어와 '일반적'이라는 단어만큼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도 없겠지만)으로 보자면 별로 빠르다고야 할 수 없는 진도였지만, 그것은 자질 부족이라기보다는 넓은 지식욕에 기인한 것이었다. 소년은 심지어 마법보다도 책을 좋아했다. 그리고 스승도 그것을 나무라지는 않았고. 골빈 칼잡이들에게라면 모를까, 마법사에게 지식이 해가 되지는 않는다(똑똑한 칼잡이가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것은 사실이고, 불행하게도 마법사의 지식이란 그 자신보다는 주위 사람에게 재앙이다)는 것이 스승의 믿음이었으니까.
어제도, 그 전날에도 그러했듯이, 석양은 곧 체념한 듯 그 손길을 천천히 거두어들이고는 꼬리를 끌며 사라져 갔다. 이윽고 석양의 빈 자리를 메꾸듯 짙은 청색에서 검은색으로 물들어가는 어둠을 보며, 어느새 하나 둘 조용히 반짝이기 시작하는 별들을 바라보던 소년은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며 창문에서 시선을 돌려 아래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평상시보다 약간 늦어질 듯 하다.
소년은 기다란 나무 주걱으로 솥을 저었다. 부글부글. 음침한 조명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냄비 속의 내용물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끓었다. 이 방의 유일한 조명인 솥 밑의 장작불과 솥이 피워내는 증기가 합세해 소년의 얼굴 위에 복잡하면서도 기괴한 음영을 새겨내고 있었다. 3주 가까이 탑 꼭대기의 연구실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않는 스승에 대해 생각하던 소년은, 탄 냄새를 맡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아차, 스튜가 좀 탔겠네.
주인의 취향을 닮았는지 침침한 조명이 군데군데 빛나고 있는 나선형 계단을 따라, 소년은 스튜 그릇을 들고 천천히 올라갔다. 탑의 내벽도 외벽과 마찬가지로 반사율 좋은 상아빛이었기에 그정도의 조명만으로도 계단을 오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나름대로 놀라운 모습이라고 소년은 생각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생동안 한 번 보기조차 힘들 마법의 불이(비록 좀 침침하다고는 해도), 이 탑 안에서는 횃불 대용으로 아무렇게나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 탑 안에서만은, 마법의 기적이란 곧 일상이었다.
똑똑. 최상층에 도착한 소년은 문을 두 번 노크했다. 어차피 이런다고 스승이 나와서 식사를 받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놔두고 가면 다음에 올때는 꼭꼭 빈그릇으로 바뀌어 나와있는 것이다. 잠시 자그마한 기대 비슷한 것에 기다려 봤지만 역시나 대답같은 것은 없었고, 소년은 스튜를 문앞에 놓고 그 옆의 빈 그릇을 챙겨서 내려왔다.
아래층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먹던 음식이 흘러내려 옷을 더럽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소년은 역시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쨌거나 2주하고도 5일, 그러니까 17일*동안이나 스승의 얼굴도 못 본 것이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뭘 하는건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동안 해야 할 일을 시키지도 않고 틀어박혀 있는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물론 책은 많으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는것은 많다. 그러나(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소년은 원래 호기심이 많았다. 17일이나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심지어 책으로도 그의 호기심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어쨌거나 14살짜리 꼬마 아닌가.
게다가 소년은 스승이 가지고 들어간 꾸러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도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대개의 경우 그렇듯이 천으로 둘둘 감아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실루엣을 가늠해보지 못하는 건 아니다. 시간도, 상상력도, 호기심도 풍부하고 할 일도 없는 소년의 머릿속에는 결국 결론이 하나 떠올랐다.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가늠해보면 그건 검일수밖에 없을 터였다. 몇마디 붙여보자면 '아주 이상하게 생긴 검'.
그래서 소년은 모종의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그때부터 소년은 밤낮없이 스승의 연구실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흘이 흘렀다.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구나.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냐. 사람이 아니라면 비슷한 거든 뭐든간에... 그 육체와 분리된 영혼... 분리해낸 영혼이나 한 개체 전체를 보석에 봉인하는 기술이야 많이 쓰곤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사고기관 없이도 봉인된 영혼이 제 기능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널려있는 용도 불명의 잡동사니들, 연구실 곳곳에 교묘하게 배치되어 거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연구실 전체를 비추는 마법의 불들 - 의외로 이번에는 침침하지 않은데다가 오히려 지나치게 밝은 것이 아닌가 싶은 - , 안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도 여기 저기 그슬려있는 방화벽(물론 방화마법을 걸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풍성한 턱수염의 마법사와 그 앞에 놓인 관찰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꼬불꼬불한 글씨와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가득한 결계와 주박들 속에서 영혼의 프리즘 soul prism 으로 실험 대상(소년의 추측대로, 검이었다)을 관찰하던 타워마스터, 아이보리 메이지는 피로해진 눈을 문지르면서 혼잣말을 시작했다. 늙은이다운 버릇이다.
"그런가, 그렇다면 이 혈석血石*이 유사기관으로 작동하는 겐가? 아니... 아니야. 사고기관만이 아닌게야... 암... 단순히 유사기관이라든가, 그런 대체물이 아니라... 차라리 영혼의 그릇이라고 부르는 편이 낫겠군. 아니... 그릇이 아니고... 그래, 차라리 이건 새로운 육체... 검신 내부로 신경계에 순환계까지 뻗어있고... 가만, 가만 보게. 이러한 구조라면, '살아 있는' 거란 말인가? 여보게, 궁금해지는데 어디 내 질문에 대답 좀 해 볼 생각 없겠나? 말 좀 해보게나. 라인"
바로 자신이 말은 커녕 최소한의 사고회로를 유지하거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지각하는 것조차 힘들정도의 결계와 주박으로 그(혹은, 그 검)를 묶어놓았다는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타워마스터는 라인에게 말을 건넸다. 말을 하는 쪽은 수염이 풍성하고 안경을 쓴데다가 복잡한 주름살을 얼굴에 그린 할아버지임은 두말 할 나위 없는 것이지만, 듣는 쪽은 매끈한 검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좀 있는 모습이다. 부검중인 시체같다고나 할까. 검신과 칼막이, 손잡이가 모두 분리되어 그 안쪽에 뻗은 혈관과 신경이 드러난 모습은, 나름대로 그로테스크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한 혈석. 말라 비틀어진 피 찌꺼기와 같이 생긴, 누천년간 세계에 발산된 악의와 고통이 모두 퇴적되어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영혼의 그릇.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그 돌은, 움직이되 살아있지 않은 언데드처럼 메스꺼움과 부조화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그 혼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전혀 인간의 영혼이 아니고. 허나... 한 때는 사람이었던 것 아닌가? 어찌 이리 될 수 있는가? 인간의 영혼이 무슨 흙이나 쇠도 아닐진대, 이렇게나 뒤틀려 있을 수 있다니..."
늙은 마법사는 고개를 저었다. 마법사라 해도 결국 인간인데, 인간의 영혼을 무슨 풀빵 찍어내듯이 틀에 맞춰 변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은 인간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역시 항간의 소문이란 의외의 통찰을 담고 있는가. 악마가 만든 칼이란 말이더냐."
아무려면 신이라든가 천사가 만들었을리는 없으니까... 늙은 마법사는 조금 쉬기로 했다. 왕년에야 수십일 밤을 지새우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연구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젠 무리인 것이다. 게다가 상대가 상대이니, 지쳐서 정신을 잃는다거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일이다. 결계를 정비해두고, 늙은 마법사는 잠을 청했다. 네다섯 시간 정도는 자 둘 생각이었다.
결국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스승이 깊이 잠들었음을 확인한 소년은 방문에서 귀를 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매일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귀를, 눈을,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스승의 연구실 안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피곤하고도 지루한 일이었지만, 그 기다림 끝에 스승이 드디어 잠들었다는 것, 다시 말해 이제 그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소년에게서 피로를 말끔히 씻어가버렸다. 소년은 대개 호기심에 가득찬 사람들이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직전에 그러하듯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눈을 빛내며 손잡이에 손을 가져갔다.
"끼기기긱..."
마법으로 충만하여 기적이 일상인 탑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볼품없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순간, 소년은 문 안에서 '두려움' 이 흘러나와 자신을 감싸는 듯한 감각에 진저리를 쳤다. 그것이 위험한 것을 만났을 때 느끼게되는 본능적인 공포일지, 위대한 스승의 명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반응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는 곧 연구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건 두 번도 없을 기회야. 과연 소년의 발걸음을 이끈 것이 호기심뿐이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질척질척한 모종의 유혹 내지 암시가 은연중에 섞여있었을지는 이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모든 것이 명백하다고 말하는 듯한 그림자 없는 조명과는 반대로 퀴퀴한 공기에 섞인 약간의 불길한 예감이 다시 한 번 경고하듯 소년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 불길한 예감은 위대한 스승님이 비록 잠들어 있지만 바로 옆에 있다는 긴장감에 섞여버린 다음 시시각각 소년의 머릿속에서 부풀어오르는 호기심에 짓눌려버렸다. 소년은 연구실의 중앙에 목적인 '무언가' 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 때, 소년이라고 하는 불확정요소가 연구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들어옴에 따라 연구실 전체에 작용하던 결계의 구속력이 급속도로 헝클어지며 약해졌다. 방향성과 조직성을 잃어버린 주력이 주박에 간섭을 일으키면서 파괴가 파괴를, 혼돈이 혼돈을 낳아 무질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갔고, 그 결과는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라인을 구속하던 수많은 결계와 주박이 단 몇 초만에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좋은 상태로 헝클어져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소년이 라인의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이미 라인은 꿈틀거리며 본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무생물의 질감을 가진 물체가 그야말로 생물적인 느낌으로 꿈틀거리며 '해부도' 에서 '검' 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분히 공포스러운 것이지만, 호기심이란 - 혹은 마법사의 호기심이란 - 공포 자체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그 공포 자체에 대해 발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소년은 그 광경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소년은 훌륭한 마법사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말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대개의 훌륭한 마법사는 바로 그 호기심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바, 이 점에서도 소년이 훌륭한 마법사의 자질을 지녔음은 드러난다.
호기심과 흥미로움, 신기함으로 응시하고 있는 소년의 눈 앞에서 라인은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그 움직임이 멎자 소년은 자신의 추측이 정확하게 - 최소한 겉보기에는 - 맞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검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 이상하게 생긴 검.
소년은 한동안 넋을 놓고 검을 바라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마법사의 탑에서 진짜 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을리도 없을 뿐 아니라, 그 검 자체가 상당한 이형異形이니만큼 소년이 한참동안이나 검에서 눈을 떼지 못한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소년은 점차 다른 형태의 충동이 머릿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요컨대, '한 번 쥐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태어나서 다뤄본 칼이라고는 식칼에 과도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검을 쥐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지는 소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이해 여부와는 별개로 눈앞의 검을 잡아보고 싶다는 충동은 점점 커져갔다. 소년은 천천히 검에 손을 뻗어,
라인을 잡았다.
물론 그 때 연구실의 문을 연 자가 경험 많고 능숙한 모험자(닳고닳은 놈팽이라고 불러도 대충 들어맞기는 한다)였다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인지 잘 알았을 것이며,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뒤 돌아볼 것도 없이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연 것도, 연구실 안에 들어간 것도 젊음으로 축복받았으되 아직 경험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애송이 제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좀 진부한 명제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일에 대해서는 후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진부하고도 쓸모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무릇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계속하기로 한다.
쿵, 하는 아련하게 먼 곳에서의 이명과도 같은 소리. 혹은 그 환상. 들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한 착각. 뒤늦게나마 마법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몸 속에서 커다란 추가 떨어진듯한 진동이랄까,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을 때의 충격에서 고통만을 전부 배제한듯한 아득한 귀울림이랄까. 늙은 마법사는 정신을 차리려고, 그리고 눈을 뜨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이제야 잠에서 깨어난 신경을 타고 한 박자 늦게 격통이 흘러들어왔다. 마법사는 고통을 느꼈다. 눈을 부릅떴다. 소리를 지르려 했다. 비명을 쏟아내려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입 밖으로 제대로 된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뭔가 익숙하면서도 그 곳에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이 목줄기를 타고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을 뿐이다.
목을 관통당한 늙은 타워마스터는 비명대신 올라오는 붉은 피거품을 느끼면서, 이미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몸이 제멋대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귀를 두드려오는 이명을 느끼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니, 어쩌면 보았다고 느낀 것일지도 모르고 그도 아니라면 이미 아무 것도 느낄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시야는 흐릿해지고 눈은 광채를 잃었다. 초점이 풀리고 시야가 좁아져왔다. 이윽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단순한 농담이었기라도 한 것처럼, 남아있던 고통마저 느낄 수 없게 된다. 그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맺히지 않는다. 이미 상을 맺을 수 없게 된 눈은 예전에 담아내던 세계의 형태를 비추지 못하고 다만 흐리멍텅하다. 고통과 어이없음이 최악의 불협화음을 일으킨 마법사의 마지막 표정은, 그 두 감정이 어지럽게 범벅된 것으로, 최후라는 단어가 붙은 것들이 보통 드러내곤 하는 비장함이나 장엄함 따위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8개의 탑은 7개의 탑이 되었던 것이고, 위대한 전승의 하나가 허무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른 이야기로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돌아가 보자면,
제자는 검을 다시 뽑았다. 내려다본 눈 아래에 널부러진, 이미 생명의 흔적조차 빠져나가버린 듯한 시체의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창백했다. 그러나 그에 대비되는 연구실의 풍경은 피 한 방울 튀지 않은 채 깔끔해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 기괴한 풍경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 피는 '먹혔으니까'.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오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다려왔던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아직 더 필요하다. 어디에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던 소년은 갑자기 깨달았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잖아. 바로 여기에.
자신이 검을 거꾸로 바꿔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전에 검은 이미 소년의 몸을 꿰뚫고 있었다. 소년의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다리에서도 힘이 빠졌고, 소년은 천천히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등에 솟아오른 뿔과도 같은 모양의 검끝만이 여전히 기괴한 광택을 내면서 움직임 없이 살아 더 많은 피를 구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 탑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영지를 대대로 다스려온 영주도,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존경받는 촌장도 알지못하는 언제인가부터 아름답던 상아빛은 바래지고 생기 넘치던 숲은 황폐해지고 외부의 틈입을 거부하던 아름답던 탑신은 담쟁이 덩굴에 휘감겨 숲 속으로 침몰하듯, 혹은 아예 숲 자체가 되어가듯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오만했던 영원에의 도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허망해진 메아리만이 남아있는 그 탑에는 수많은 소위 '모험가' 들이 침입하여 한때는 위대했던 상아빛의 탑을 허물고 빛나던 지식을 약탈하고 아름답던 보물을 훔쳐갔다. 수만의 새벽이 깨어나고 수천의 보름달이 사위고 수백의 첫눈이 내리고 난 뒤에야 무너진 탑에는 빽빽하게 푸른 이끼가 끼었고 잊혀진 동굴은 무너져 다만 어둠이 되었다. 그리고 오직 아무도 그 유래를 알지 못하는 마법사의 탑이라는 이름만이 유령처럼 제자리에 남아 언제나처럼 불타는 석양과 함께 옛 영광을 희롱하고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는 일주일은 6일.
*실제 보석인 혈석(혹은 혈옥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00년 모월 모일에 작성
2004년 9월 11일에 최종수정
역시나 묵은 티가...
아아 이거 어떻게 이어 쓴답니까.
2004/09/11 21:56
2004/09/11 21:56
TAG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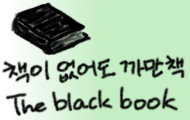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겔겔겔 시간이 있으면 쓰는거고 없으면 못쓰는거지...
사실 쓰고 안쓰고는 본인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만...
오래 버려뒀더니 애들이 좀 감이 멀어져서 말이야...
Hello! I could have sworn Iíve visited this website before but after looking at some of the articles I realized itís new to me. Anyhow, Iím certainly delighted I discovered it and Iíll be bookmarking it and checking back frequently!
Spot on with this write-up, I actually feel this website needs much more attention. Iíll probably be back again to read through more, thanks for the advice!
Spot on with this write-up, I actually feel this website needs much more attention. Iíll probably be back again to read through more, thanks for the advice!
Oh my goodness! Incredible article dude! Thanks, However I am experiencing troubles with your RSS. I donít know the reason why I can't subscribe to it. Is there anyone else having similar RSS issues? Anyone who knows the solution can you kindly respond? Thanx!!
Aw, this was an extremely nice post. Finding the time and actual effort to create a very good articleÖ but what can I sayÖ I put things off a whole lot and don't seem to get anything done.
Aw, this was a really nice post. Taking the time and actual effort to create a very good articleÖ but what can I sayÖ I put things off a whole lot and never seem to get anything done.
This is a great tip particularly to those fresh to the blogosphere. Brief but very accurate informationÖ Many thanks for sharing this one. A must read post!
I want to to thank you for this good read!! I definitely enjoyed every little bit of it. I have you bookmarked to look at new stuff you postÖ
Oh my goodness! Impressive article dude! Thank you so much, However I am going through troubles with your RSS. I donít know why I can't join it. Is there anybody else having similar RSS problems? Anyone that knows the answer can you kindly respond? Thanx!!
Excellent site you have got here.. Itís hard to find excellent writing like yours nowadays. I truly appreciate people like you! Take care!!
I seriously love your blog.. Very nice colors & theme. Did you create this website yourself? Please reply back as Iím wanting to create my very own site and would love to find out where you got this from or exactly what the theme is named. Appreciate it!
I really love your website.. Pleasant colors & theme. Did you make this site yourself? Please reply back as Iím hoping to create my very own site and would love to know where you got this from or exactly what the theme is called. Many thanks!
Hello there! I could have sworn Iíve been to this web site before but after going through some of the posts I realized itís new to me. Anyways, Iím certainly pleased I discovered it and Iíll be book-marking it and checking back frequently!
I truly love your site.. Excellent colors & theme. Did you create this site yourself? Please reply back as Iím hoping to create my own personal website and would love to know where you got this from or just what the theme is named. Kudos!
Oh my goodness! Incredible article dude! Thank you, However I am encountering issues with your RSS. I donít understand the reason why I can't subscribe to it. Is there anybody else having identical RSS problems? Anyone that knows the answer can you kindly respond? Thanx!!
Excellent site you've got here.. It’s hard to find good quality writing like yours nowadays. I honestly appreciate people like you! Take care!!
Phantom takes second spot in Apple’s US App Store utilities category
เช่ารถขากรรไกรความสูงมาตรฐาน